![[BK 그라운드] 스카우트가 봉(鳳)이냐?](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baseballkorea/2023/02/we0bos_1.jpeg)
[BK 그라운드] 스카우트가 봉(鳳)이냐?
1년에 50,000KM 움직이고, 6개월 이상 출장
박봉에 비정규직 대다수, 팬들 비난에 갑질이란 오명
야구란 이름의 열정 페이로 하루하루 버티는 그들
"저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Scout). 참 멋진 단어다.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삶.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에겐 꿈의 직업이다. 물론 실상은 녹록지 않다. 한 스카우트는 자신의 삶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했다.
지방 구단 스카우트 A씨는 지난해 자차로 전국을 누볐다. 누적 킬로수만 50,000km에 이른다. 하루에 200km 이상을 달려야 도달 가능한 수치다. 일반인 가운데 차 좀 탔다고 자부하는 이가 30,000km.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가 40,000km 언저리다. A씨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내 직업을 운전 기사로 알고 있다. 매일 차에서 통화하고 차에서 만나기 때문”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운전뿐만이 아니다. 업무 강도 또한 매우 높다. 사물에 비유하면 돌보다 단단한 다이아몬드급이다.
스카우트는 야외 업무가 90% 이상이다. 평균 출장 횟수만 1년 기준 6개월이 넘는다. 휴무나 연차는 언제나 가득 쌓인다. 특히 이동이 많고, 장거리 운전이 잦아 언제나 졸음운전에 노출된다. 스카우트 B씨는 “고속도로에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 졸음운전이 원인이다. 지방 출장 기간엔 온종일 경기 보고, 선수보고, 또 영상 찍다가 바로 이동할 때가 많다. 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어 조금도 쉴 틈이 없다. 스카우트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 대회가 몰리는 여름엔 뙤양볕 아래 12시간 이상을 버티고 앉아 선수를 관찰한다. 그런 까닭에 미세먼지나 황사, 각종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된다. 스카우트 C씨는 “야외 업무가 가장 힘들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2018년엔 정말 곤욕을 치렀다.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지방 A구단은 스카우트 예산 책정에 인색하다. 출장비 규모가 고등학교 야구부 수준에도 못 미친다. 지방 출장 시엔 여인숙보다 조금 더 깨끗한 모텔을 찾아 헤매다 겨우 입실한다. 식대는 김밥 전문점을 제외하면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전국대회가 주로 개최되는 서울 목동 구장 주변은 교육열로 뜨겁다.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 김밥 한 줄도 3,000원이 넘는다. B구단은 신분 차별이 심하다. 정규직은 4성급 이상 호텔에 묵는다. 비정규직은 모텔을 전전한다.
스카우트는 대부분 계약직이다. 초봉 평균 2,500만 원. 그나마 많이 주는 구단은 3,000만 원 남짓. 연차 쌓인 정규직들은 그나마 낫다. 비정규직은 최소한의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 여기다 대다수가 10개월만 일한다. 길게는 3개월 동안 무직자 신분이다. 물론 월급도 없다. 생계를 위해 알바를 고민하지만, 그것도 구단 눈치를 살펴야 한다. 강제 무급 휴직인 셈이다.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단 점도 뼈아프다.
학교 야구부로 자리를 옮긴 전직 스카우트 D씨는 “비정규직은 퇴직금 정산조차 쉽지 않다. 10개월밖에 일할 수 없는 구조가 치명적이다. 일이 없는 기간에 개인 레슨이라도 해야 하는데 구단이 제재한다. 품위 유지가 그 이유다. 그 말을 듣고 일찍이 이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 야구인은 스카우트 보직을 맡은 후 1년 만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 적응에 힘썼던 그다. 스카우트 시작 후 평생 보지 않던 영어 문법책을 꺼냈다.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미국 야구 도서를 구매했고, 새로운 메커니즘과 이론까지 연구했다. 1년 뒤 그에게 돌아온 건 보직 이동 통보였다.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갑자기 부서를 옮기란 소리를 듣고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스카우트 업무가 저 사람들에겐 쉬워보이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부서 이동이 잦다는 건 해당 보직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보지 않는단 뜻아닐까요?.” 한 야구인의 말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일들은 구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스카우트들에겐 매우 흔한 일이다.
스카우트란 직업은 경험과 데이터가 쌓일수록 빛난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노하우가 필요하단 이야기다. 마치 오래 익을수록 맛있는 김치와 같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스카우트팀은 일반적으로 구단 내에서 잠시 거처가는 자리로 인식된다.
다 참을 수 있다. 한 가지만 빼면. 바로 가족이다. G스카우트는 매주 출장을 떠난다. 이젠 가족들 얼굴마저 희미하다. 아이는 크고, 아내는 늙는다. 가족과의 상봉은 꿈속에서나 이뤄진다. “하루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 영상 통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 전화를 끊고 숙소에서 혼자 엉엉 울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더라. 그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그날 찍은 분석 영상을 정리했다.” 스카우트의 삶이다.
적은 밖에도 있다. 여론이다. 선수를 뽑다 보면 희비가 교차한다. 눈에 보이는 성적에 따라 잘했냐, 못했냐가 판가름 난다. 선수의 성장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다이아몬드를 줍고, 금을 캐도 세공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저 단단한 돌일뿐이다. 그러나 야구 기사 댓글엔 언제나 스카우트 욕이 넘쳐난다. “이것도 선수라고 뽑았냐.” “너넨 도대체 뭐했냐” 등등. 대부분의 댓글이 이와 같다. 잘 크면 구단 육성의 승리. 못 크면 스카우트의 무능이다. 지방 구단 관계자는 “옛날 이야기지만, 하루는 구단 고위 관계자가 스카우트에게 반성문을 써오라고 시키더라. 다 큰 어른한테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보는 내가 다 민망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현실 속 스카우트는 약자다.
아직 더 있다. 주변 시선이다. 요즘 스카우트들은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학부모들과 일체 접촉하지 않는다. 몇 년 전만 해도 목동 구장 기자실엔 각 학교별 학부모들이 준비해온 음식들로 넘쳐났다. 이것 뿐이겠는가. 일부 스카우트들은 뒷돈이나 각종 접대를 요구하고, 저녁 늦게 연락을 해 술값까지 계산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렇다보니 온갖 민원이 빗발쳤다. 지금 목동 구장 기자실엔 식당 전단지만 가득하다. 특정 학부모들의 출입은 일절 금지했다. 스카우트 업무 외에 불필요한 만남은 사절이다. 투명한 선수 지명을 위해 작은 행동 하나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각 구단 스카우트 모두 노력하고 있다. 오른팔에 새겨진 구단 엠블럼과 한국 야구의 발전은 스카우트들의 무한한 노력 덕분이다.
최근 본 기사 하나가 떠오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도 무단으로 훈련을 강행한 학교 운동부 이야기다. 한데 댓글을 보니 난리통이다. 스카우트가 압력을 가해 훈련을 강행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본 기사의 주체는 해당 학교와 운동부지 당시 훈련을 지켜봤던 스카우트가 아니다.
H스카우트는 “나도 당시 해당 학교에 있었다. 사전에 일정을 문의했고 해당 일에 훈련이 있다고 해 전체 일정을 잠시 미루고 해당 학교에 간 것이다. 스카우트가 갑질을 했다? 무리한 훈련을 요구했다? 어떤 스카우트도 학교 일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훈련을 강요했단 자체가 억측이다. 우린 학교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고, 진행되는 상황에서만 관찰한다. 차후 우리 선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부상이나 컨디션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조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스카우트의 삶. 이젠 봉(鳳)이 아니라 봉황(鳳凰) 대접을 받아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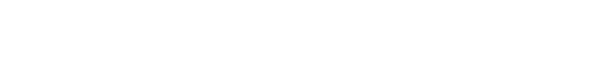
![[BK 히어로 06] 대통령배 뒤흔들 괴력의 파이어볼러, 휘문고 김휘건](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baseballkorea/2023/07/tgqb65_KakaoTalk_Image_2023-08-01-00-08-52.jpeg)
